VOL.24
202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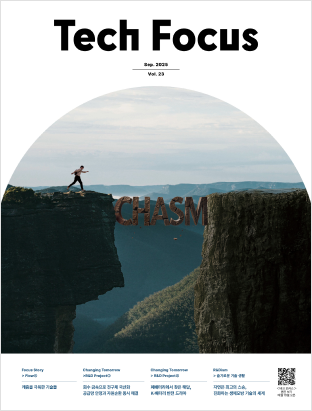
더 이상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사고능력을 갖춘 휴머노이드는 점차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들은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맺는 존재로 다가온다. 로봇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앞두고, 우리가
마주한 법적·윤리적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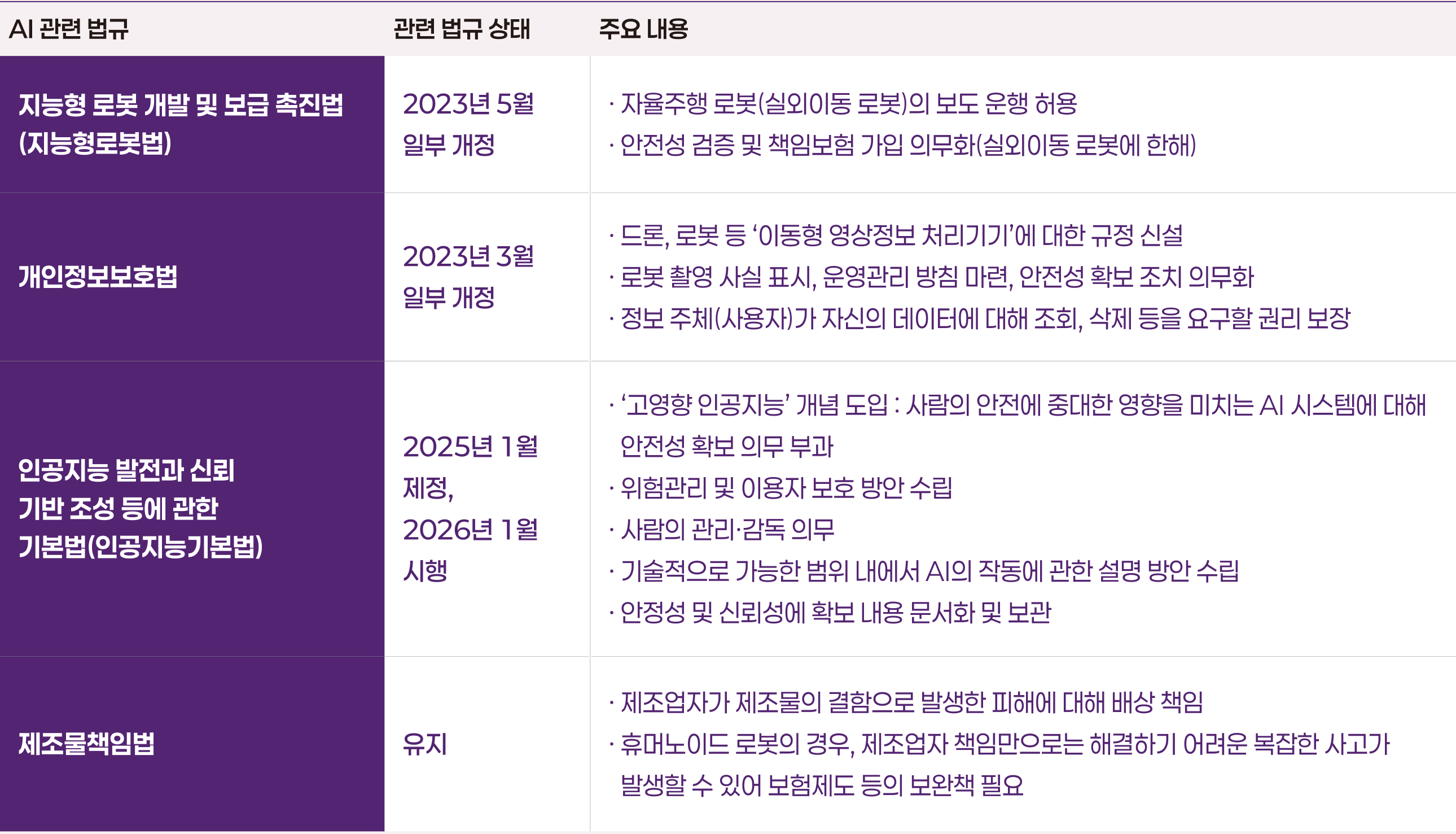




 이번 호 PDF 다운로드
이번 호 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