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19
2025.05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는 총 5만1876명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실제로 장기기증 및 이식이 진행된 건수는 4414건. 평균 1441일을 기다렸다.
그리고 그 시간을 버티지 못했던 2907명이 세상을 떠났다. 인공
장기에 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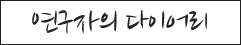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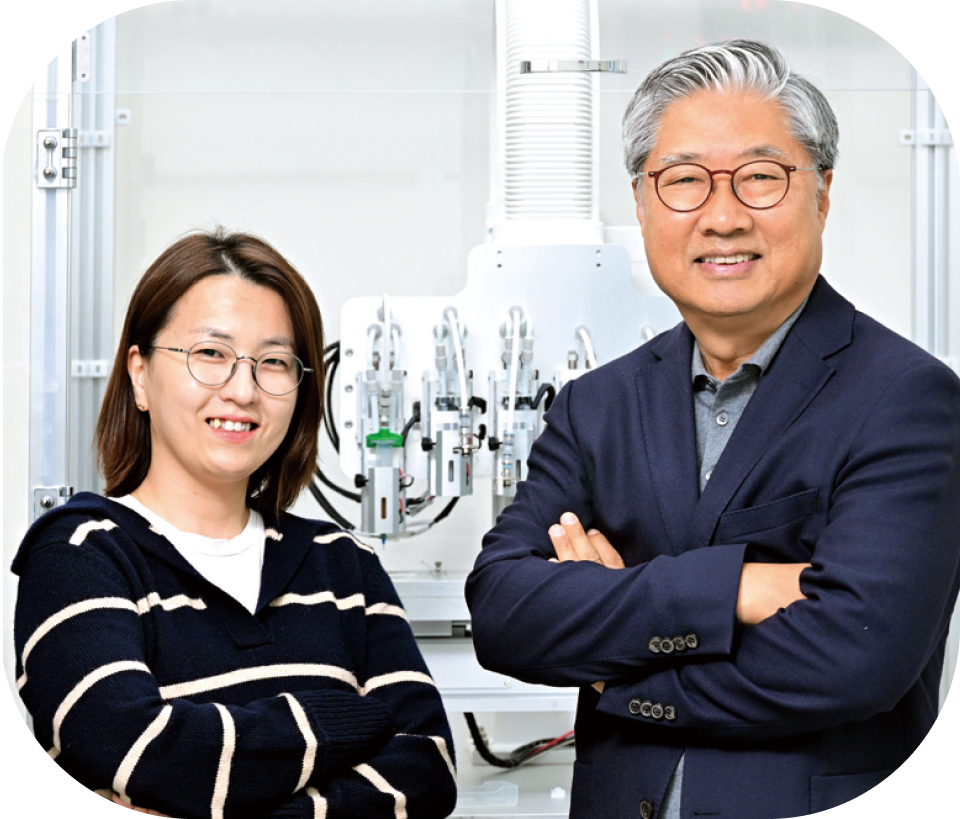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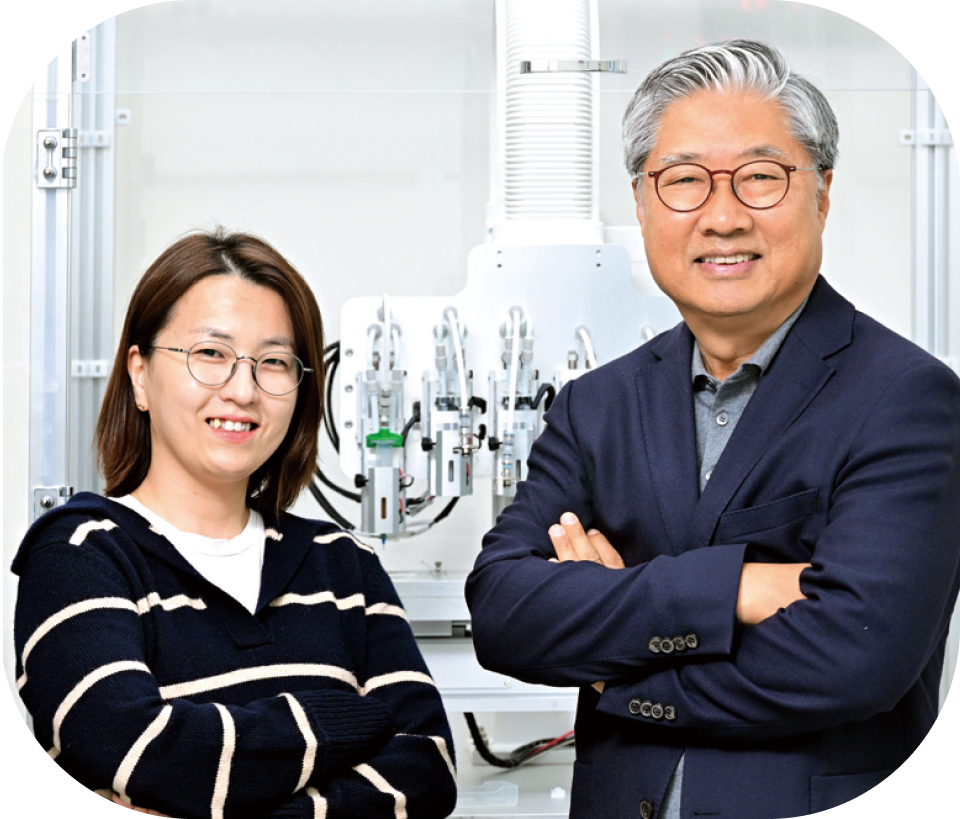
 이번 호 PDF 다운로드
이번 호 PDF 다운로드 